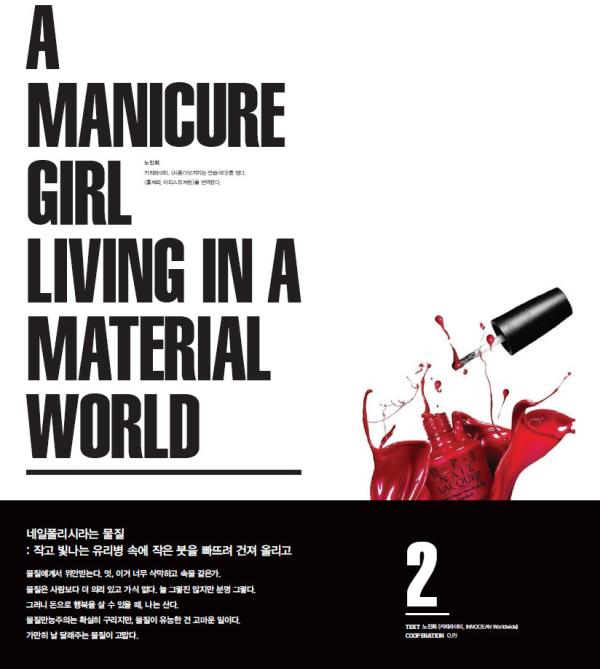
솔직히 네일폴리시를 몇십만 원어치씩 사 모으는 사람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게.
네일폴리시 수집. 더 쉽고 흔한 말로 매니큐어 모으기. 그리 오래된 취미는 아니다. 1년 전쯤이었나. 뚜렷한 계기도 없었다. 네일숍에 가는 대신 네일폴리시를 사 모으기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건 어쩌면 돈을 아끼는 행위였을지 모른다. 네일케어 한 번 받는 돈이면 국산 네일폴리시 네댓 개를 살 수 있었다. 나는 알뜰한 여자가 되고 싶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더 비싸고 싱싱한 술과 안주를 사 먹고 싶었다.
퇴근길에 맘에 드는 색을 사와 바르곤 했다. 작고 빛나는 유리병 속에 작은 붓을 빠뜨려 색을 건져 올리고, 그 붓 끝에 맺힌 방울방울을 손톱 위에 평평하게 펼쳐놓는 일. 재미있었다. 현 남편이자 당시 남친은 이런 나의 새로운 취미를 환영했다. 한창 발색 중인 날 보는 그의 눈빛엔 청아하게 난을 치는 규수를 바라보는 흐뭇함 같은 게 어려 있었다. 흥겨운 가무 중(물론 그 전엔 흥겨운 음주가 있었습니다) 노래방 다락방에서 추락, 그로 인한 척추골절로 3개월 이상 옷 위로 코르셋을 차고 다닌 전적이 있는 여성에게 생긴, 여성적인 취미. 그는 무척 좋아했다. 지금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다. (미안, 알고 싶지 않아. 몰라야 계속 이렇게 사 모을 수 있을 거 같거든)
강남역 일대 로드숍에 한정돼 있던 내 소비생활은 대체 언제부터 글로벌해진 걸까. (생각 없이 사 모으기만 하다 이 글을 쓰며 비로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디네일 ‘민트라떼’가 O.P.I ‘mermaid’s tears’의 dupe(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똑같은 네일폴리시를 일컫는 말. 물론 덕후들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이다”란 정보는 일반적으로, 비싼 O.P.I를 사느니 저렴한 모디네일을 사라는 권유다. 나는 거꾸로였다. 모디네일 ‘민트라떼’가 있었지만 ‘mermaid’s tears’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색을 설명하는 ‘민트’ 같은 단어 하나 없이 색을 상상하게 하는 로맨틱한 이름하며, ‘캐러비언의 해적’ 컬렉션 중 하나라는 점, 게다가 구하기 어려운 단종이란 점까지 가세해 ‘꼭 갖겠어’란 각오가 거칠게 타올랐다.
해외 네일폴리시를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로를 알게 된 나는 천국으로 통하는 땅굴이라도 뚫은 양 몹시도 까불었다. 그렇게 까불며 엄청 사재꼈는데, 우선, 발색사진만 보고 내 눈에 든 컬러들을 ‘소신껏’ 위시리스트에 담았고, 국내외 네일블로거가 극찬하는 컬러들 역시 ‘열린 마음으로’ 주저 없이 담았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위시리스트와 장바구니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들이었다. 난 분명 ‘오늘은 그냥 골라 담아놓기만 하고(그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사야지’ 하는 심산이었는데, 어느새 위시리스트는 비워져 있고, 카드결제 내역을 알리는 휴대폰 알림이 도착하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기뻐하고, 동시에 후회가 밀려드는 만감의 교차를 경험하고 있다.

O.P.I ‘Instinct of Color’ Viral/Web Film. 2013 칸 Film Craft Lions Effects 부문 브론즈 수상

그 색이 그 색 같은데 뭘 그렇게 자꾸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하나뿐이다. 하늘 아래 같은 색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두 네일폴리시의 색 감정을 의뢰하고 100%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아도, 여기 또 질감이란 영역이 있다. 살짝 드라이하게 발리는 페인트 질감, 미끄러지듯 발리는 크림 질감, 쫀득 쫀득한 젤리질감, 미끄러지듯 부드러운 와중에 쫀득 쫀득하기도한 크렐리질감. 텍스처가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있다. 만져보면 설탕가루를 뿌려놓은 듯 까끌까끌한 픽시더스트 네일(슈거 네일, 샌드 네일 등 브랜드마다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일부러 주름진 느낌을 주는 크링클 네일, 바르자마자 쫙쫙 갈라져 악어가죽 무늬를 남기는 크랙 네일, 흐르는 듯 매끄러운 새틴 네일, 들여다보고 있는 내 모습이 비칠 정도로 미끄덩한 미러 네일, 정말 캐비아 같은 알갱이들을 손톱에 붙여 완성하는 캐비아 네일, 이 밖에 레더 네일, 스웨이드 네일 등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질감이 있다.
반짝이가 들어 있는 글리터 네일도 참 다양하다. 그 특징에 따라 시머펄, 프로스트펄, 편광펄, 홀로그램펄, 플레이키 등으로 구분하고 진짜 금이나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 있는 것도 있다. 이토록 네일폴리시가 다양한데 내가 중심 딱 잡고 필요한 것만 샀을 리 만무하다. (애초에 취향의 영역에서 ‘필요’란 말을 꺼내는 것부터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일폴리시 본연의 색감이나 반짝임에만 홀려도 부족함이 없을 판에, 이름이라는 변수가 또 날 굉장히 자극한다. 어느 해외 브랜드의 한정판 슈렉 컬렉션 중 ‘Who the Schrek are You?’ ‘Fiercely Fiona’, 독일 컬렉션 중 ‘Ger-manicure’, 텍사스 컬렉션 중 ‘Do You Think I’m Tex-y?’ 같은 위트 있는 이름들은 언어유희 참 좋아하는 카피라이터의 감성을 건드린다.
‘아, 나도 저기 가서 같이 이름 좀 짓고 싶네.’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느 브랜드의 네이밍은 전부 노래 제목이다. Space Oddity의 우주적인 영롱함, Lady Sings the Blues의 깊게 깔린 블루, Today Was a Fairytale의 꿈같은 반짝임은 나름 음악애호가인 내 감성에 짙게 호소한다. Kristin, Bevin, Suri처럼 사람 이름으로만 네이밍하는 브랜드도 있는데, 이는 사람 좋아하는 나의 인류애(?)에 불을 지펴 결국 구매에 이르게 한다.
정말이지 작고도 확실한 행복이다. 문자 그대로, 작다. 네일폴리시는 이 세상 많은 유리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유리병 축에 낄 것이다. 사람들이 즐겨 모으는 양주병, 향수병과 비교해도 현저히 작다. 내 7단짜리 헬머 서랍장엔 아직 발라보지도 못한 네일폴리시가 많다. 몇 개인지 세어보는 건 너무 겁나서, 결코 해선 안 될 일이다.
안 바를 것 같으면 안 사면 된다는 것도, 이 정도 샀으면 살 만큼 샀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을 끝내고 나면 난 또 홀린 듯 쇼핑몰로 자동 입장할 것만 같다.
‘위시리스트에 담아놓기만 해야지’ 해놓고 결제내역 문자를 받게 될 것만 같다.

















































